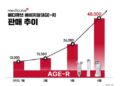‘무기한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은 무거운 침묵 속 불안한 표정의 환자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희귀·중증 질환 등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이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 불안함을 호소했고 응급 치료 뒤 입원하지 못한 환자의 보호자들은 상태가 악화할까 두려움에 떨었다. 휴일이라 병원 안 환자와 보호자는 눈에 띄게 적었지만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해 ‘의료 대란’까지 불러올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만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이날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 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함께 병원 응급진료센터를 찾은 이모(52)씨는 “이 병을 치료하려면 대부분 서울대병원으로 올 수밖에 없다”며 “이곳이 아니면 어차피 아산병원이나 다른 대학병원을 찾아가야 하는데 다른 곳도 모두 휴진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말초신경계에 손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신경통, 보행 장애, 근력 저하, 감각 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각 이상 마비가 다리부터 위로 점차 올라오고 호흡곤란까지 오는 경우도 있다. 이씨의 아버지는 올 2월 서울대병원에서 희귀질환 진단을 받았지만 의정 갈등이 이어지면서 입원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지내면서 외래진료를 받으려고 서울대병원을 찾는다.
이씨는 “희귀질환센터와 응급진료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교수들이 모두 휴진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아니겠나”라며 “2차 병원도 찾아봤지만 이곳 아니면 치료받을 수가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응급진료센터 앞 보호자 대기실도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가끔 한숨 소리만 새어 나왔다. 남동생을 돌보고 있는 한 60대 보호자는 “평일에는 응급진료센터에서 울고 비명을 지르는 환자들이 많다. 생지옥이 따로 없다”며 “(동생은) 응급치료를 받고 12시간 넘게 대기하다 입원했다. 그나마 운이 좋은 것”이라고 전했다. 위암이 재발해 병원을 찾은 환자의 보호자 최모(48)씨는 “봐 줄 의사가 없다고 해서 입원도 못 했다”며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후 이 병원 후문에서는 대한노인회 회원 30여명이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의사들은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과 긴급 진료를 해야 하는 환자까지 팽개치고 무기한 휴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